聖山, 마차푸차레 - Annapurna 4일째
2007.11.07 02:47

나는 히말라야에서 보았습니다
속도를 다투지 않는 길과
본성을 잃지 않는 영혼과
문명의 비곗덩어리를 가볍게 뚫고 들어와
내장까지 밝혀 주는 햇빛과 바람
그리고
만년 빙하를 이고 있어도
결코 허공을 이기지 못하는 설산

△ 첩첩 계곡이 만나는 저 멀리에 안나푸르나 설산이 보인다.
댓글 4
-
이름
2008.03.17 15:44
-
이승진
2008.03.17 15:44
사진 현상금은 간첩잡아서 그 현상금으로....ㅎㅎㅎ
결론은 안 주시겠단 말씀인데.
참고로 본방도 받을 생각도 전혀 없소이다.
콕' 찍어만 주시면 'Anna'의 精氣가 팍팍 서린 놈으로 현상해드리리다.
분부만 내리소서. -
이름
2008.03.17 15:44
무씬 말씀을 그리 심하게도 하시나요? 간첩이 안잡히면사채를...^
아무리 몰인정 한 넘이지만 그래도 개미 좃같이 쪼꺠한 양심만은 ..^^
찍사본인이 절정에서 느낀 수많은 오르가즘 중에서 제일 화끈하고 짜릿한것 하나 골라서요^^^
~몰섹~ -
홍성수
2008.03.17 15:44
한마디로 멋~~지다.
몰아~~ 니는 흥정 할때도 섹~답게하네...
멋진 사진에..감동적인 글발에..섹~넘치는 독자에..
오금이 저린다..계속 수고..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363 | 덕수궁의 재발견 [2] | 고박 | 2007.11.20 | 318 |
| 362 | 글 (# 395) 첫사랑에 관한 자습서 [1] | 정용정 | 2007.11.20 | 311 |
| 361 | 금수산 원정 산행 [1] | 고박 | 2007.11.20 | 327 |
| 360 | 다시 첫사랑에 관하여 [4] | 정용정 | 2007.11.19 | 528 |
| 359 | 용마 산악회 안내!!!(제97차 정기 산행) | 심재구 | 2007.11.19 | 294 |
| 358 | 동기 여러분 삼가 감사 드립니다 [3] | 이홍규 | 2007.11.18 | 316 |
| 357 | 친구들께 오랫만에 노래선물 보냅니다... [3] | 고박 | 2007.11.17 | 1361 |
| 356 | 가장 소중한 일 [1] | 우상 | 2007.11.17 | 568 |
| 355 | 백락(伯樂) [4] | 정용정 | 2007.11.16 | 459 |
| 354 | 감기 조심하세요 [3] | 정용정 | 2007.11.15 | 330 |
| 353 | 서울의 가을도 참 아름 답네요... [1] | 고박 | 2007.11.12 | 406 |
| 352 | 종호대형! 대구에 이런데도 있단다... [1] | 고박 | 2007.11.11 | 478 |
| 351 | ▶◀ 訃告 - 이홍규 동기 부친상 [5] | 회장단 | 2007.11.10 | 351 |
| 350 | 눈의 거처, 히말라야 - Annapurna5일째 [4] | 이승진 | 2007.11.09 | 571 |
| » | 聖山, 마차푸차레 - Annapurna 4일째 [4] | 이승진 | 2007.11.07 | 629 |
| 348 | 아버지!!! | 심재구 | 2007.11.06 | 449 |
| 347 | 바람의 말, 룽다 - Annapurna 3일째 [1] | 이승진 | 2007.11.03 | 608 |
| 346 | 나마스테-Annapurna 2일째 [6] | 이승진 | 2007.10.31 | 717 |
| 345 | 용마산악회 산행안내 | 악우회 | 2007.10.31 | 335 |
| 344 | Annapurna를 향한 첫걸음 - 1일째 [8] | 이승진 | 2007.10.30 | 6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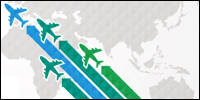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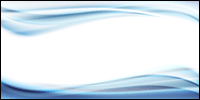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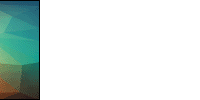

모든 여건 체력 경비..가 된다면 정말 가보고 싶은곳이네.
찍사님 박은 사진중에서 제일멋진 사진 하나 골라서 현상해주소
밑에 날짜 제외하고요 ^^ 현상금은 간첩잡으면 보내줄테니..^^몰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