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마스테-Annapurna 2일째
2007.10.31 19:30

여행이란, 마치
다음 生에서가 아니라 이 生에서
다른 生을 살아보는 일.
이방인의, 결코
녹록지 않은 삶속으로 들어가서
내 영혼을 말갛게 씻어내는 일.

◑ 10월 19일, Anna 2일차 일정 ◐
08 : 30 일행 중 5명 카트만두 -> 포카라 공항 이동
09 : 30 나머지 19명 카트만두 -> 포카라 공항 이동후 합류
10 : 30 포카라 -> 트레킹 출발지인 담푸스로 버스 이동
(아래는 원래 예정 일정)
12 : 00 페디 (1130m) -> 담푸스 (1650m) -> 톨카 (1700m) 에서 중식 ->
란드럭 (1565m) -> 뉴브릿지 (1340m) -> 지누단다 (1780m) 도착
20 : 30 트레킹 소요시간 9시간 예정
7시에 기상.
기다림으로 더 길어진 旅路의 피곤함을 숙면으로 잘 다스린 듯하다.
컨디션은 90% 수준.
'나마스테~'라며 두 손을 모두는 종업원과 인사를 나눈다.
쌀죽 한 그릇을 먹고, 커피와 함께 페스츄리를 더해 가벼운 아침요기를 했다.
풍요의 여신, ANNAPURNA를 만나러 가는 설레임에 입맛도 조금은 가시는데다,
내 생각의 바닥엔 하루평균 8시간 이상 강행군을 하기 때문에
식사량을 정량(?)만 유지해도 웬만큼의 diet는 가능하리란 욕심이 있었다.
여정을 마치고 돌아갈 쯤엔 '魔의 70벽'을 깰 수는 있을까? 
8시 30분에 포카라행 1진 7명이 탈없이 출발하였고,
대기하던 무석이와 나도 9시경에 호텔을 나서서 '포카라 가기'재도전에 나섰다.
1진은 예정대로 출발하여 Pokhara에 도착하였으나,
남은 2진, 우리들의 기다림은 어제의 스토리에 이어지고 있다.
9시 30분 출발 예정이라던 비행기가 감감 무소식이더니
11시 10분에는 출발한다며 방금 모니터를 통해 알려준다.
둘러보니 이 곳 공항에서 유일한 브라운관이었고, 우리나라 LG의 20인치 제품이다.
그나저나, 어제 시작했어야 할 트레킹 일정에
아직도 카트만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오늘 일정은 '안봐도 척'이다.
2일째 숙소인 '지누단다(1780m)'까지 도착하려면 8시간은 부지런히 걸어야 한다던데....
'우야꼬^^;;'

프로펠러의 굉음속에 다시 떠오른 경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히말라야의 雪山들은 어제보다 높았고, 더욱 눈부셨다.
그 거대한 등뼈들은 지구를 지탱하기에 충분하였으며, 육중하였고 또한 길었다.
저기 어딘가에 전설속의 'Yeti'는 분명 살고 있을 것이며, 그것의 생명 또한 영원할 것이다.
장대하게 솟은 풍경속에서 내 몸은 점점 움츠려 들고,
포카라에 착륙하기 위해 고도를 낮추면서 기체는 두꺼운 구름속에서 잠시 흔들렸다.
구름 아래엔 무채색 단조로움 대신 다양한 스펙트럼 풍경이 펼쳐졌으나 참으로 아늑했다.
히말라야 연봉을 배경으로 어우러진 호수경관이 아름다워 포카라를 찾는 여행객들이 늘고 있다는
'Phewa Tal(페와 호수)'도 활주로 가까이로 보였다.
오늘 機長은 카트만두로 되돌아가야 하는 수고가 더이상 필요치 않을 것같다.

30여분의 비행끝에 Pokhara 공항에 발을 내디뎠다.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것은 無名나무다.
세련된 여인의 자켓위에서 보았음직한 악세사리같은 빨간 깃털의 꽃을 나누에 피워올렸다.
그 나뭇가지에서 일렁이던 Pokhara의 바람은 기분좋을 만큼 살랑이며 귓불을 애무한다.
이제 시작이다.
우리는 트레킹의 출발지, 담푸스를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지나면서 20~30마리씩 무리를 이룬 염소를 몰아가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
물어보니 오늘이 네팔의 열흘간 축제인 추수감사절인 '띠하르 축제'란다.
고향집에서는 염소를 잡아 그 피를 받아서 신에게 바치며 감사하고,
흩어졌던 형제, 친지들이 모여서 남은 고기를 먹으면서 정을 나누는 네팔의 큰 명절이라 한다.
로컬버스의 지붕에는 짐대신 고향을 찾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위험해 보였지만 그들에겐 일상이었고, 보고있는 나보다도 한결 여유로웠다.
이곳, Nepali들 답지않게 생뚱맞게 배가 나온 버스 운전수는
연신 클락숀을 울리면서 북새통의 시내를 벗어났고,
Trekking map에 분명 highway라고 표시된 길로 들어섰지 싶은데도
중앙선은 아예 보이지 않고, 마주오는 차를 피하느라 핸들을 조금만 꺾어도
한 쪽의 바퀴는 비포장길에서 털컹거리며 우리와 함께 요동을 쳤다.
가지가 우거진 나무가 모인 초록 숲과 가난한 마을이 이마를 맞대듯 붙어 있다.
집 밖 넓은 마당에서 보란듯이 직접 염소를 잡는 모습이 자주 보였으며,
걔중에 더러는 커다란 검은 소가 벌겋게 해체되어지기도 하였다.
시야를 조금만 멀리 두면
雪山이 녹으면서 시작된 강물은 마을을 끼고 흘렀다.
강줄기는 넉넉하여 부드럽게 보였으나 아직도 힘을 잃지 않고 구비쳤다.
네팔의 오지 곳곳을 더 누비다가 힌두의 성지, 갠지스강에 이르기엔 아직도 가야할 길은 요원하다.
저 강물을 거슬러 오르면 분명 히말라야에 닿을 수 있을 것이다.
그 곳, 신성한 기운속에서 나는 며칠을 보내다 올 것이다.
단지 그 사실 하나에 나는 또 감사한다.
△ 가족들이 모여 염소를 잡는 모습이었데, 장면은 확실히 나타나지 않네요. 

히말라야 산군을 조망하기 좋다는 해발 1592m의 Sarangkot을 힘겹게 비켜 올랐다.
다음 마을을 향해 내려왔다가는 이내 길을 따라 뱀처럼 기어서 버스는 또 올라섰다.
드디어 담푸스를 향하는길목, 트레킹 예정지인 1130m의 Phedi 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선 우리들과 함께 할 포터들과 쿡팀이 기다리고 있었다.
위 사진 가운데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이 leader이자, 조리책임을 맡았던 '뚜르바'인데,
우리나라 히말라야 원정대와 함께한 경험도 많고, 한국에도 여러번 초청받아 다녀갔다 한다.
한국말도 웬만큼 잘하였다.
예정보다 많이 늦어진 시간 때문에 우리들은 여기서 내리지 않고,
출발지를 산행 시간이 1시간 정도 짧고, 길도 편한 Naya Pul로 바꾸기로 하였다.
대기하던 서포터들을 더 태우고 버스는 다시 무거운 길을 나섰다.


꾸불꾸불한 길만큼 다양한 이국풍경 보여주면서 버스는 달렸다.
부지런한 농부들이 산허리에 심어둔 나락들은 누렇게 익어갔다.
그 풍경속에 내가 있다.
그런데 그 길을 힘겹게 오르던 버스마저 설상가상으로 멈춰 서버렸다.
엔진 과열로 'overeat'을 한 것이다.
조수와 함께 엔진을 식히고 물을 채우면서 생똥을 싸던 와중에
우리는 굴렁쇠를 하며 놀던 형제아이들과 조우하였고,
대나무로 짠 망태의 끈을 헤어밴드처럼 두르고 밭일을 나온 아줌마들도 덤으로 만났다.
내 어릴적 생각이 잠시 추억으로 떠올랐고,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내가 먼저 '나마스테'하며 인사를 건네었고, 배낭에서 꺼내어 간 쵸코바를 나누었다.
그들의 눈은 이곳 산골만큼 깊었으나 한결같이 맑았다.



나야풀에 도착한 시간이 1시 30분.
예정보다 한참 늦었다.
카고백은 포터들이 지고갈 것이며 우리와는 떨어져 갈 것이기에
야간산행을 대비해 랜턴을 준비하란 나관주 대장의 지시가 있었다.
마을의 초입은 많은 가게들로 북적였다.
롯지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도매상들과 트레커들과 직접 상대하는 가게들이 이어졌다.
무리를 이룬 유럽 트레커들이 빠져 나오고 있는 마을속으로 나는 배낭을 메고 들어섰다.
산간 마을에서 쓸 물품을 담은 푸대를 양쪽으로 매단 나귀들은 풀을 뜯으며 쉬고 있다.
안나푸르나에서 발원한 Modi khola강은 쉬지않고 여전히 왼쪽에서 우렁차게 흘렀다.



강폭이 좁아져 20m정도 되는 콘테이너같은 다리 건너에 Birenthanti 마을이 있었다.
지도를 의하면,
여기서 왼쪽으로 접어들면서 급하게 고도를 올리면 3193m의 POON HILL 전망대를 거쳐서
고레파니로 이어지는 라운드 트레킹을 하게 되고,
오른쪽으로 접어 들어서 강을 따라 거슬러 오르면 안나푸르나 산군들과 닿게 되고,
MBC와 ABC를 향하는 트레킹 루트가 된다.



처음 맞는 Lakshmi 롯지다.
2시 25분. 늦은 점심이다.
롯지를 잠시 둘러보는 사이에 쿡팀은 감자를 썰어넣은 수제비를 끓여 내었다.
3찬으로 나온 배추김치를 비롯해 깍두기들이 우리 입맛에 맞다.
한국에서 준비한 것인줄 알았는데 쿡팀이 현지에서 담았다가 가져온 것이란다.
트레킹 일정에서 먹는 것에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Ghandruk을 향하는 마을길은 넓었지만 차는 아예 다니지 않았다.
귓가에서 들리는 물소리가 작아지면서 Modi Khola강은 아스라히 멀어지기도 했고,
큰 산을 받치는 배경으로 인해 직벽을 이룬 폭포에선 떨어지는 물소리는 꽤 우렁찼다.
어느새 강이 나란히 보인다 싶으면 가까운 발치에 늙은 개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고,
여럿의 병아리를 거느린 어미닭은 낯선 우리를 피해가며 먹이를 쪼아댔으며
우리들은 이내 마을에 닿을 수 있었다.
마을에서도 그나마 길쪽을 차지한 집엔 어김없이 롯지 간판을 내걸었지만
그것들은 초라한 구멍가게에 불과했다.
그래도 주인장은 바쁜 걸음을 옮기는 우리를 향해 '나마스테' 인사를 잊지 않는다.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갑자기 비를 쏟아붓는다.
가게에서 비를 피하면서 배낭커버를 씌우고 우산을 받쳐든다.
빗줄기는 굵고 거칠어도 바람이 없는 편이어서 우산으로 충분히 몸을 가릴 수 있다.
이래저래 오늘은 쉽지 않은 길이다.
Annapurna 神이시여~
우리들에게도 그대의 넉넉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부디 먼길을 열어주소서.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雨中山行이다.
카메라는 아예 배낭안에 넣어 버리고 빗속으로 들어섰다.

비내리는 길만 바라보며 뚜벅뚜벅 걸어가는 일행에게 누군가 "저길 보라!"고 소리친다.
박범신 선생이 가리키는 손끝으로 저멀리 회색구름위에서 설산이 고고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배낭커버를 벗겨내고 카메라를 꺼내들은 나는
처음 만나는 Annapurna를 향해 연신 셔터를 누르고 줌으로 당겨도 본다.
왼쪽의 설산이 Annapurna South(7219m),
오른쪽에 솟은 것이 물고기 꼬리 모양을 한 Machhapuchhre(6993m)이다.
그냥 허공에 '툭~' 걸린채 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 기이한 형상이다.


산정이 보석처럼 빛나는 聖山을 보고 난 연유에서일까?
비가 흩뿌리는 1940m의 간드럭마을을 어렵지 않게 오르며 지나쳤다.
땀흘리며 오른 산을 돌아가면 다시 강을 향해 고도가 떨어지는 길이 내내 이어졌고,
그 길에서도 나의 걸음은 쉬이 지치지 않았다.
우릴 위해 무거운 수고를 짊어지고 오르는 포터들에 비하면 나의 순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산그림자에 다가설수록 마차푸차레는 어둠속에서도 더 높이 솟아있었다.
산정에 감도는 붉은 빛의 해질녘 聖山, 마차푸차레를 보았을 땐 절로 경외감에 사로잡혔다.
6시를 넘기자 히말라야에도 어김없이 어둠이 밀려왔다.
이제부터는 헤드랜턴으로 길을 밝히는 야간산행 모드이다.
가야 할 봉우리에 박힌 롯지의 불빛은 등대불처럼 목표지점을 알려주었고,
그 불빛은 손에 잡힐만큼 가까운데도 보통 한시간이 넘는 발품을 팔아야 비로소 닿곤 했다.
현재 시간, 7시 30분.
Kyumi(큐미) 마을에 도착하였다.
무석이와 나는 찰떡파이와 함께 물을 들이키고는 숨을 돌렸고, 기념사진도 박았다.
참으로 숨가쁘게 올라왔다.
잠깐의 휴식으로 원기를 회복한 우리에겐 아직도 남겨진 문제가 있었다.
다음 마을인 New Bridge의 해발이 1340m에 불과하단 것이다.
하산길도 아닌데.
2000m를 오르내리며 여기까지 왔는데 또다시 고도를 낮추어야 하다니......
정말 맥이 '탁~' 풀리는 순간이다.


랜턴도 밝히지 않은 채 길을 재촉하던 포터들이 내리막길에서 쉬고 있다.
캄캄 밤길을 걷는 그들이 참으로 신기하였으며, 우리들에게 산행중의 화제거리였다.
시험삼아 내 머리위에서 길을 비추던 랜턴을 잠깐 꺼고 길을 걸어보려 했다.
어둠속에서 나는 몇 초 버티지도 못하고 불을 켜야만 했다.
오히려 멀쩡한 포터들을 두고 나는 걱정거리만 더 생겨 버렸다.
예정시간 10시에서 15분을 더 넘겨서야 Jhinu Danda(1780m) 마을에 도착했다.
그러나 쿡팀을 빼고는 포터들은 아직 아무도 도착하지 않았다.
배낭을 맨채, 우리가 막 올라온 길을 뿌듯한 마음에 내려다 보았다.
거기엔 마을의 은은한 불빛만 일상처럼 박혀서 히말라야의 밤풍경이 되어 있다.
포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아주 늦은 저녁을 먹었다.
구수한 누룽지까지 뚝딱 해치우며 맛있게 먹었다.
옛말에 '일이 상놈'이라 했거늘, 틀린 말이 아니었다.
어느새 하늘은 티없이 맑게 개었고,
산이 높아선지 총총한 별들은 낮게 내려앉아 모두가 북극성인양 밝게 빛나고 있다.
우리의 숙소인 'Namaste lodge'를 비추는 초승달은 달무리를 거느렸고,
어스름 속에서 제 살을 채우며 유일하게 실속을 차렸다.
기다리던 나의 카고백이 끝으로 도착하였다.
카고백 두개씩은 거뜬히 매는 편인데 비하면
카고백에 작은꾸러미를 얹어 상대적으로 적은 부피인데도 늦게 도착했다.
아직은 경력이 모자라 보이는 스무살 정도의 앳된 청년이었다.
"내일도 내 것을 맡아달라"는 말과 함께 영양보충용으로 간식거리를 가져다 주었다.
긴 길에 지친 몸을 설산의 물로 샤워하고 나니 새벽 1시.
내일 일정에 나도 쉬어야겠다.
먼저 침낭속에 들어가서 번데기(?)가 되어 누운 무석이는 나비가 될 꿈을 꾸는 것일까?
쾌히 먼길 동행해 준 친구가 있어서 히말라야의 깊은 밤도 결코 춥지 않다.

댓글 6
-
이승진
2008.03.17 15:44
-
별구름
2008.03.17 15:44
홈피에는 홈피지기가 있어야 홈피 들어오는 맛이 있다.
승진아 대단하고
너무 부럽다. -
이름
2008.03.17 15:44
좋은 사진과 글 솜씨로 최고의 기행문이네.
'세상은 보는 만큼 보인다'
승진 찍사의 탁월한 안목에 감탄할 뿐이오.
계속 흥미진진..
무석과 승진 그대들 사이에
내 있었으면.. 내 있었으면..
11월의 첫날 깊어가는 가을밤에
따끈한 시집이나 한 권 사서 읽어야지.
그대들의 기행에 동참하지 못한 대리만족으로...
*^J^* 용정 -
이승진
2008.03.17 15:44
증욱 / 전쌤, 잘 지내시제?
빛나는 별을 바라보면서도 별구름님 생각을 미처 못했었네;;
육안으로도 별자리 관찰하기 좋을만큼 또렷했었는데
무식하게도 모두 북극성으로 쳐 두었으니.....ㅉㅉ
*^J^* / 옆구리 찌를 때 함 더 고려해 보시지, 그래.
따뜻한 시집 한 권도 탁월한 선택이지요.
마음이 動하는 구절은 올려주시구려 -
홍성수
2008.03.17 15:44
'나마스테~' 승진!
사진 과 글을 읽다보니 내가 동행하고 있는것 같네..
공짜로 여행해도 되는기가? 아님 한잔사야 되는긴가?
흥미진진 다음편이 기대되네.. -
심재구
2008.03.17 15:44
고등학교 수학여행때 밤새 기차가 달려 도착한 곳이 '설악산', 어둠이 깔려 주위는 모든것들이 깜깜 했건만..
다음날 아침 웅장한 산새를 보고 놀라, 그때 생각에 우리 구덕산은 산이 아니고 동산처럼 보이더만
오늘 안나푸루나를 승진을 통해 보니 한국의 산들이 '동산'들이네.....
정말 친구들이 자랑스럽기만 하다!! 31만세!! 만만세!! 승진, 무석 만세!!! 만만세!!!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363 | 덕수궁의 재발견 [2] | 고박 | 2007.11.20 | 318 |
| 362 | 글 (# 395) 첫사랑에 관한 자습서 [1] | 정용정 | 2007.11.20 | 311 |
| 361 | 금수산 원정 산행 [1] | 고박 | 2007.11.20 | 327 |
| 360 | 다시 첫사랑에 관하여 [4] | 정용정 | 2007.11.19 | 528 |
| 359 | 용마 산악회 안내!!!(제97차 정기 산행) | 심재구 | 2007.11.19 | 294 |
| 358 | 동기 여러분 삼가 감사 드립니다 [3] | 이홍규 | 2007.11.18 | 316 |
| 357 | 친구들께 오랫만에 노래선물 보냅니다... [3] | 고박 | 2007.11.17 | 1361 |
| 356 | 가장 소중한 일 [1] | 우상 | 2007.11.17 | 568 |
| 355 | 백락(伯樂) [4] | 정용정 | 2007.11.16 | 459 |
| 354 | 감기 조심하세요 [3] | 정용정 | 2007.11.15 | 330 |
| 353 | 서울의 가을도 참 아름 답네요... [1] | 고박 | 2007.11.12 | 406 |
| 352 | 종호대형! 대구에 이런데도 있단다... [1] | 고박 | 2007.11.11 | 478 |
| 351 | ▶◀ 訃告 - 이홍규 동기 부친상 [5] | 회장단 | 2007.11.10 | 351 |
| 350 | 눈의 거처, 히말라야 - Annapurna5일째 [4] | 이승진 | 2007.11.09 | 571 |
| 349 | 聖山, 마차푸차레 - Annapurna 4일째 [4] | 이승진 | 2007.11.07 | 629 |
| 348 | 아버지!!! | 심재구 | 2007.11.06 | 449 |
| 347 | 바람의 말, 룽다 - Annapurna 3일째 [1] | 이승진 | 2007.11.03 | 608 |
| » | 나마스테-Annapurna 2일째 [6] | 이승진 | 2007.10.31 | 717 |
| 345 | 용마산악회 산행안내 | 악우회 | 2007.10.31 | 335 |
| 344 | Annapurna를 향한 첫걸음 - 1일째 [8] | 이승진 | 2007.10.30 | 6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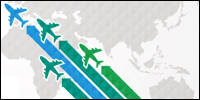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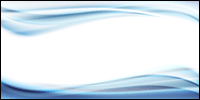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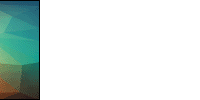

홈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지금 적고있는 중입니다.
해량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