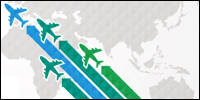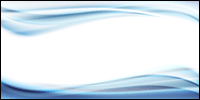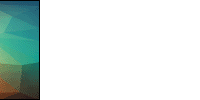<논어 혹설> 4 - 왜 或說인가
2012.03.17 16:39
이 혹설은 ‘설교’가 아니다. 공자도 설교하지 않았는데, 언감생심... 그런 뜻이 '혹설'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다. "혹시 누군가가 했을 법한..."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도 어떨까..." "누군가는 분명히 물어보았을 법한..." "진정 물어야만 하는..."의 뜻을 담고 있다. 그러다 보니, 或은 惑이라... 그래서 "자칫 사람들을 잘못 인도할 수도 있는...독이 든..." 흡.
나는 헤르메스를 자처한다. 아득한 시기, 고전 한자로 쓰인 공자의 삶과 언술이... 지금 암호가 되 버렸다. 2.500년 전 아닌가. 한문 ‘고전’이 대체로 그렇지만, <논어>는 이를테면, “난파된 타이타닉에서 남은 널빤지 몇 조각”같은 것... 감이 오실 터... 시간도 아득하지만, 죽간(竹簡)이라는 제한된 서판에 씌어진 글자들은 도무지 <배경>이나 <맥락>을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가령, 양호의 경우는 개략 배경이 짐작되지만, 유비의 경우는 전혀 알 수 없다. 신분이 높은 사람인지, 그냥 아는 사람인지, 수교 대장 말대로, “나쁜 놈”인지, 아니면 좋은 놈인지... 이뿐만이 아니다. <논어>는 질문을 대개, 한 글자(!)로 압축하고 있다. ‘子路問政“, ” 子張問行“, ”樊遲問仁“ 등이다. 실제 대화에서는 상세하고 구체적이었을 것이다. 이 <맥락>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심각한 오해에 빠져든다. 그것을 찾기 위한 수천년의 노력이 있다! 경이로울 지경이다. 또 문장 안에서 사용된 단어의 의미도, 한문의 특성상 온갖 가능성에 열려 있다. 그 다양성을 추적하는 재미는 전문가들에게 열려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子曰 道不行 乘桴 浮于海 從我者 其由與 子路 聞之喜 子曰 由也 好勇過我 無所取材
개략 번역하면 이렇다. “공자 말씀 왈, 道가 행해지지 않아, 뗏목을 타고 바다로 나갈 제, 나를 따를 사람은 바로 ‘자로’겠구나.” 자로가 듣고서는 기뻐했다. 공자가 말했다. “자로야, 용기를 좋아하는 것이 나를 지나쳐, ‘取材’할 바가 없다.”
아시다시피, 공자, 중원의 무질서와 업사이드 다운을 경험하고, 그것을 바로잡고, 민생을 윤택하게 하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천하를 다녔으되, 결국 빈손이니, 어디 다른 나라로, 가령 九夷로나 가 볼까... 뗏목을 타고서... 그런 인상을 준다(*아하, 이 통념에 함정이 있다... 상세는 아래!!)
여기 나를 따라 나설 사람은 자로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더니, 자로는 그 소리를 듣고 좋아했다. 그런데 공자의 마지막 말이 애매하다. 사람들은 공자가 자로의 ‘만용(?)’을 쫑코준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제 논어에는 자로를 핀잔 주고 말리는 대목이 많다.)
일반적으로,
1) 그렇게 물불 안 가리고 “갑시다!” 하고 나설 위인이니... 쯧쯧, 無所取材, “너를 대체 어디다 쓰겠느냐?”로... 읽었다.
그런데 이런 엉뚱한 해석도 있다.
2) 다른 주석 하나는... 材를 ‘재목’으로 읽는 사람도 있었다. “자로야, 용기는 가상하나, 그러나 뗏목을 묶을 통나무 재료가 없지 아니하냐?‘ 푸하,
이 해석은 좀 코메디다. 전체 맥락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다산 정약용의 새 해석이 정곡을 찔렀다. 누구도 보지 못했던 안목이다.
다산은 공자는 지금 자로를 “쫑코 주려는 것이 아니라,” 칭찬한 말이라고 <거꾸로> 해석했다. 번역은 이렇다.
“내 도는 행해지지 않는다. 뗏목을 타고 험한 바다로 나서는 격! 그런데도 나가자고 나서면, 따라 나설 자는 자로 하나일진저. 그의 용기는 나보다 뛰어나다. 그는 앞뒤를 재지 않는다.”
다산은 “無所取材”의 材를 ‘잔머리, 계산’으로 읽었다. 뗏목은 공자가 가진 道의 작은 배이다. 풍랑에 위태롭게 흔들리는 작은 배...
제자들 대부분이 器, 정치적 출세에 목매 있고, 행정 관료로서의 역할을 맡기를 원했다. 공자가 생각한 이상(道)은 2차적 관심이었을 것...“한 3년 공부하고 출세를 기웃거리지 않는 인간이 드물다”고 탄식한 적이 있다. 자로는 달랐다.
어떻게 그 험한 바다를 뗏목 타고 나서겠는가. 그런 말도 안되는 ‘돌격명령’에 앞 뒤 재지 않고 따라 나설 사람은 진정 자로밖에 없다는 것.. 자로는 스승의 그 ‘무한 신뢰’에 목이 메었다. 그래서 기뻐했던 것이다. 자로는 모자라는(?) 바보가 아니다. 천만에!! 괄괄한 건달이었고, 처음 공자를 혼내주려고 갔다가, 그 조용하고 단단한 기세에, 무릎을 꿇고 제자가 된 인물이지만 공자와 더불어 수십년, 지적 훈련을 보태 거물이 되어 있었다. 공자가 “한 나라의 재정을 감당할 만한 인물”이라고 추천했을 정도이다. <논어>에거 자공, 안회와 더불어 가장 매력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
하여간,
이 첩첩 난관을 지나, 공자 발언의 <의미>와 <맥락>, <배경>을 전해주는 것이 내 일... 그 ‘번역문’을 통해 고민하고, 사유하는 것은 동기 제위의 몫이다.
듀런트, 언젠가 자신은 언젠가 "애매함에 대한 골족의 혐오감"을 갖고 있다고 한 적 있다. 나도 그렇다. 학생들에게 늘 주문하는 것이 있다. "애매하기보다 틀려라. 틀린 것은 고칠 수 있지만, 애매한 것은 대책이 없다."
번역을 완전히 현대식으로 풀어나갔다. 어투에 농담과 속어도 섞인 것은 '근엄함'을 희석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 공식 마당에서는 이 ‘오버’에 온갖 비난이 난무하겠지만, 그러나, 이곳은 ‘사적 공간’이다. 그리고 나는 聖經(*유교 경전을 본시 성경이라 했다. 언어의 교역이란!!)의 문자에 집착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메세지’를 붙들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번역은 문자적 옮김이 능사가 아니다. ‘반응의 동시성’, 즉 공자가 발언할 때, 어느 노나라 사람이 지적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것과, 내가 한 번역을 듣고,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것 사이에, 얼마나한 일치와 공명이 있느냐가 관건인 것!!
아차,
늘, 먹물들은, 사설이 길다. 그냥... <논어>를 ‘전달해 주기만 하면 될 것“을... 이제, 사설은 접고... 공자님 말씀으로... 도시락 하나 들고... 여행을... 떠나 보자.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3383 |
벌써 이번주도...
| 고영호 | 2010.01.29 | 215 |
| 3382 | 만남2 | 서동균 | 2010.06.01 | 215 |
| 3381 | ★광안리불꽃축제★ | 고영호 | 2010.10.29 | 215 |
| 3380 | 무더운 여름 잘들 지내십니까? | 동기회 | 2011.07.26 | 215 |
| 3379 |
2월 9일(월) 부산 곳곳서 정월 대보름 행사 '풍성'
[1] | 고박 | 2009.02.08 | 216 |
| 3378 | ‘아버지의 병’ 전립선암 [1] | 고영호 | 2009.07.20 | 216 |
| 3377 | "감기와 어떻게 구별해요?"…신종플루 대처법 | 고영호 | 2009.08.25 | 216 |
| 3376 |
2009년도 경남중고등학교 사하구 총동창회 정기총회(1)
| 류명석 | 2009.10.10 | 216 |
| 3375 |
2009년도 경남중고등학교 사하구 총동창회 정기총회(2)
[1] | 류명석 | 2009.10.10 | 216 |
| 3374 | 용마산악회 정기산행 안내 | 악우회 | 2009.06.08 | 216 |
| 3373 | 서부지회 8월정기모임안내 | 서부지회 | 2009.08.12 | 216 |
| 3372 | 근심은 허수아비다. [1] | 박종규 | 2010.01.29 | 216 |
| 3371 | 달라이라마의 "용서" [1] | 박종규 | 2010.11.01 | 216 |
| 3370 | 감사 인사 [2] | 김재술 | 2011.10.05 | 216 |
| 3369 | 즐거운 설 명절되시길 바랍니다 | 동기회 | 2012.01.22 | 216 |
| » | <논어 혹설> 4 - 왜 或說인가 | 한형조 | 2012.03.17 | 216 |
| 3367 | 제 40회 재경 기별 야구대회 조추첨 결과및 대회 일정!!!! | 심재구 | 2008.03.15 | 217 |
| 3366 |
청계포럼 2010년 1월 설악산 원정산행!!!
[3] | 고영호 | 2010.02.02 | 217 |
| 3365 | 마음이란??? [2] | 박종규 | 2009.07.29 | 217 |
| 3364 | 도대체 "시간"이란 무엇인가? | 박종규 | 2011.07.15 | 217 |